오늘의 한국은 묘한 모순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비어 있는 아파트, 텅 빈 상가,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지식산업센터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내 집 없이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 낡고 위험한 주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불균형은 ‘투기와 금융 중심의 부동산 구조’가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GESARA 시대에는 이 모순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리게 됩니다.
1.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기본권
GESARA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보금자리’를 갖는 것이 기본권으로 인정됩니다.
빈 아파트는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무주택자나 노후 주택 거주자들에게 무상 또는 상징적 비용으로 개방됩니다.
“집은 있는데 살지 못하는 사람”과 “사람은 있는데 집이 비어 있는” 지금의 모순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2. 금융 굴레의 해체
지금까지 집과 상가는 대출, PF, 건설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실제 수요자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GESARA의 채무 탕감과 금융 시스템 재편은 부동산 가격의 허상을 무너뜨립니다.
주거 공간은 더 이상 투기의 상품이 아니라, 실제 필요에 따라 배분되는 자원이 됩니다.
3. 상가와 지식산업센터의 재활용 — ‘업종 제한의 벽이 풀릴 때’
지나치게 공급된 상가와 오피스 건물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 공간들은 공동체 센터, 교육장, 창작 공간, 복지 시설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또 하나의 숨은 벽이 있었습니다 — 바로 **“지식산업센터의 업종 제한”**입니다.
현재 한국의 지식산업센터는 ‘지식 기반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입주 가능한 업종이 연구, 정보, 과학, 신기술, 학원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시농업·치유센터·숙박형 교육·커뮤니티 하우스 같은 실제 수요가 있어도
법적으로 입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생겼습니다.
건물은 텅 비었는데, 들어가려는 사람은 막혀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지요.
GESARA 시대의 전환은 바로 이 벽을 허물어줍니다.
경제·법·행정의 틀이 재정렬되면서,
‘업종’보다 공간의 의식 수준과 사회적 목적성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즉,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활동’이라면
그것이 연구든, 교육이든, 농업이든, 예술이든 모두 지식산업의 확장된 형태로 인정됩니다.
그때가 되면
도시농업, 치유·명상센터, 영성 리트릿, 창조 공동체, 숙박형 학습공간 등이
새로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가 됩니다.
비어 있던 건물들은 그렇게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 허브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4. 노후 주택의 순환
낡은 주택에서 힘겹게 살던 사람들은 새 아파트와 개방된 공간으로 옮겨갑니다.
남은 노후 주택지는 점차 정리되어 녹지화·공동체 정원·마을 재생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는 숨을 쉬고, 사람들은 더 건강한 환경을 누리게 됩니다.
5. 도시의 패러다임 전환
GESARA 시대의 도시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영혼의 삶에 맞추어 설계됩니다.
‘집이 있지만 집 같지 않은 구조’, ‘상가가 있지만 삶과 연결되지 않는 구조’는 점점 사라집니다.
대신 도시는 살아 있는 유기체적 마을처럼, 사람과 공간이 유연하게 연결되는 모습으로 재탄생합니다.
“모든 공간은 결국 의식의 그릇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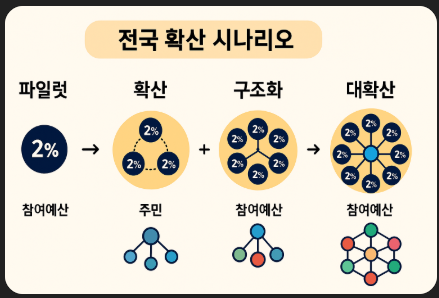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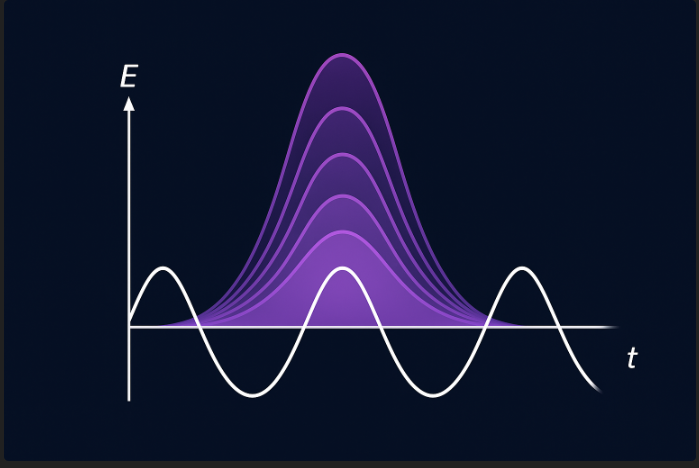
답글 남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